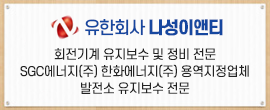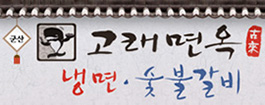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장신구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사냥꾼들이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펜던트를 걸고 다녔고 에스키모 여인들은 약혼만 해도 배꼽걸이를 차고 다니며 정조를 지켰다. 1927년 발굴된 기원전 2500년대 도시국가 수메르 여왕 묘에서는 금으로된 목·귀걸이는 물론 팔지 발찌 심지어 눈걸이 코걸이 입술걸이 유방걸이 즉 인체의 문(門)이란 문은 모두 봉쇄하는 온갖 걸이의 유물로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만큼 장신구의 종류가 다양했음이다. 장신구중 치아와 관련된 것도 다양해 옛날 우리나라 기방에는‘정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었다. 정든 이가 떠나며 정표로 이를 뽑아주고 가면 이‘정낭’에 담아 청술 홍술 엮어 외출 할 땐 저고리에 달고 다녔다. ▼최근 이빨에 붙이는‘이찌’가 등장했다. 팥알 크기인 이 ‘이찌’는 금 다이아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류로 만든다. 심미적 개성과 멋을 과시하는 각종 장신구인 셈이다. 좀 웃기긴 하지만 온통 원성과 악취뿐인 요즘 세상이라 신기하고 재미있다. 올 1월 처음 선을 보였는데 아직 반응은 신통찮단다. 하지만 60대도 노랑머리를 즐기는 세상이니 50주부가‘이찌’를 한들 혀를 찰일은 아니다. 머지않아 아프리카 여인들처럼 젖꼭지에 묵직한 추를 달거나 코에도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여성들을 흔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체엔 30여 곳에 펜던트를 달 수 있고 여인의 심미적 욕구는 무한하다니 말이다. 잠시 살다가는 인생, 후회없이 살겠다는 데 누가 탓하랴. 다만‘정낭’에서 보듯 우리 조상들은 장신구 k나에도 정리와 의리를 담았듯이 우리도 뭔가‘인간의 냄새’가 나는 장신구를 달았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