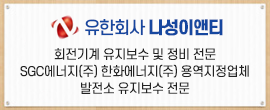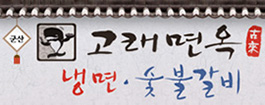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컬럼/기고
김철규 시대상의 시각
제22회 이리역(현 익산) 폭발사건1<날벼락 폭음에 박살난 이리대참사>

한마디로 전장터다. 1977년 11월 11일 밤 9시 15분 이리역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은 이리 시가지를 박살냈다. 쾅, 쾅, 쾅 고막을 찢는 3발의 폭음은 15초 간격으로 고즈넉이 깊어가는 이리 시가를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시간에 친구의 초대로 이리시내 중심지 모 음식점에서 3명이서 저녁을 먹고 한국과 이란간의 월드컵축구 예선전을 보기위해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축구구경을 하는 순간 갑작스레 천장의 샹들리에 전등이 펑 하면서 방바닥에 떨어진다. 정전은 물론, 전화도 불통이다. 이 자리에는 신문기자와 기관원으로 민감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써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시가지는 칠흑이고 중앙 중심지도로는 유리조각으로 깔려 반짝거리고 있을 뿐이다. 시내 가옥들은 태풍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고 지붕, 간판, 유리창은 우박처럼 쏟아져있다. 또한 잿더미에 눌린 환자들의 단말마와 길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가족 찾는 울부짖음이 을씨년스런 초겨울의 밤공기를 찢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밀려든 날벼락이다. 하늘을 치솟는 섬광이 번뜩이고 폭약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의 660분의 1에 해당하는 위력을 지닌 폭발사고라고 한다. 한마디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즉시 편집국장에게 긴급보고를 한다. 편집국장은 임시 특별취재반을 구성하고 나에게는 현장취재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재지시를 한다. 밤샘을 하면서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의 현황이 어떤지 우선 인명피해부터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새벽에 전주 본사에서 달려온 취재기자는 김현기 반장을 비롯해 6명으로 분야별 취재하도록 한다. 필자는 밤샘하는 과정에서 12일 새벽 5시경 이리역 대합실 안 한쪽 모서리에 고개를 숙이고 쭈그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 “누구냐”고 물었으나 “노숙인” 이라며 약간의 술 냄새까지도 풍기면서 바깥으로 걸어 나간다.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는 설마 범인이 대합실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못하고 다른 곳만 피해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순간 의문의 판단이 부족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최초로 범인을 발견하고도 놓치고 말은 것은 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랐다.
날이 밝아오면서 피해상황이 서서히 밝혀지는데 너무도 어안이 벙벙했다. 한국화약 소속으로 다이너마이트, 뇌관 등 1,139상자 폭발물을 적재하고 11월 9일 밤 9시 42분 인천을 출발, 10일 밤 10시 31분에 이리역 도착, 11일 밤 10시 30분에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만 폭발사고를 낸 것이다. 이날 사고는 당시 호송책임자 신무일 씨(36․인천시 남구 논현동 66)가 술을 마신 뒤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촛불이 넘어져 화약상자에 인화되면서 폭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가 술을 마시게 된 것은 원래 화약열차는 목적지까지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데 인천에서 이리역까지도 5~6시간이면 충분하고 이리역에서도 10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부조리 모순이 잠재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신 씨는 이리역 앞에 나가 술을 마신 뒤 화약 칸에 들어가 논산역에서 구입한 초에 불을 켜놓고 침랑 속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불 지피는 소리에 잠을 깬 신 씨는 그대로 열차 밖으로 뛰쳐나와 본인은 생명을 구했으나 이로 인해 화약에 불이 지피면서 폭발했으며 전장터를 방불케 한 것이다. 인명, 재산 등 헤아릴 수 없는 참사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