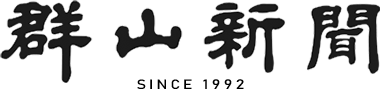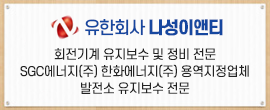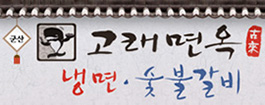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일제강점기 군산항 창고에 일본인들에게 넘겨줄 쌀을 빼곡히 쌓아놓았다. 수탈의 현장이다.
3월 1일 군산지역에서도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린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 비중으로 가장 많은 수탈과 차별의 경험을 가진 군산의 아픈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와 시민 등 700여명이 참여해 3.5만세운동을 재현한 평화시민 대행진이 펼쳐졌다.
일제강점기 군산에는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거주했나?
일제강점기 군산사람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일본인일 정도로 많은 일본인이 거주했다.
군산시사 등에 따르면 1930년 군산시 인구는 2만5,960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인은 1만6,541명이고 일본인은 8,781명, 나머지 638명은 기타 외국인이었다.
이는 일본인이 전체인구 중 33%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1930년 당시 부산의 일본인 비중은 32%, 서울 26%, 청진 24%, 목포 22%, 원산 21%, 대구 20%, 함흥 20%, 마산 20%, 인천 17% 순으로 일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의 일본인은 개항 이후부터 군산에 이주하기 시작해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고 한국이 강제 병합되자 그 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개항 당시인 1899년에는 77명, 1910년(융희 4)에는 3,488명, 1919년에는 6,809명으로 갈수록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일본인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일제의 척식 정책에 따른 농장 설립을 통한 미곡 생산과 무역을 독점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야마구치현, 나가사키현, 에히메현 출신들로 농업 자본가, 미곡상, 정미업, 양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들은 농업 경영에 뜻을 두고 군산지역 토지를 매입해 나갔다.
그 결과 구마모토[熊本]·모리키쿠[森菊]·후다바사[二葉社] 농장과 같은 대형 농장들의 설립이 군산과 옥구 지역에서 이어졌다.
◇군산사람들이 농사지은 쌀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기는 통로인 군산항 뜬다리부두(부잔교).
<사진제공=박형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같은 대형농장 설립으로 일본에 이출(移出)된 미곡의 양이 1925년 99만8,769석(石)에서 1934년에는 228만5,114석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이출되는 미곡의 양이 늘어날수록 군산지역 농민들의 삶은 힘들어져 갔다.
많은 미곡을 생산했지만 미가의 가격은 낮았고 많은 미곡이 일본으로 이출되며 자신들이 소비할 수 있는 미곡량은 제한됐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잡곡을 수입해 소비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또한 일본인 지주들의 소작권 이동과 고율 소작료 부가, 제반 비용 전가로 농민들은 토지에서 이탈해 토막민의 삶을 살아갔다. 그렇기에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일본으로의 미곡 이출은 수탈적 성격을 띠었다.
당시 군산은 일제의 식민 지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수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미곡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수탈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한강 이남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3월 5일 학생,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돼 일제 수탈과 차별에 맞서 만세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항일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