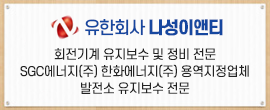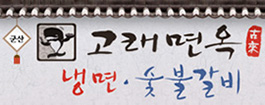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겨우내 잠들었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소생하는 계절이 봄이다.
흘러간 노래 가사처럼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이지만 아쉽게도 봄은 갈수록 짧아져, 봄이 왔는가 하면 벌써 저만치 가버리고 만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개할 즈음이면 불청객 황사가 하늘을 뒤덮어 봄 기분을 망친다. 그러니 얼음장 밑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나, 잔설이 희끗희끗한 가운데 핀 매화를 감상할 줄 알아야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지난 6일 경칩(驚蟄)이 지났다. 날씨가 따뜻해져 초목의 싹이 돋고 동면(冬眠)하던 동물이 깨어 꿈틀대기 시작한다. 이때가 되면 몸을 보한다고 해서 개구리 알을 먹는 풍속이 있었으며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했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등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시작해 농촌은 아연 활기를 되찾는다.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히 문을 여니/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흐르도다/멧비둘기 소리나니 버들빛 새로워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들 정학유(丁學游)가 한글로 정리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2월령을 보면 이른 봄 전원의 풍경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그 전원은 양반 사대부들의 유람이나 오늘날 도시인들의 봄 나들이 대상이 아니라 농부들의 노동의 현장이었다. '솔가지 찍어다가 울타리 새로 하고/장원도 수축하고 개천도 쳐 올리소/안팎에 쌓인 검불 정쇄히 쓸어내어/ 불놓아 재 받으면 거름을 보태려니….' 땀 흘리며 밭 갈고 씨 뿌리는 노고(勞苦)를 게을리 했다가는 가을의 결실을 맛볼 수 없는 것이 인과(因果)의 법칙 아닌가. 얼었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던 비가 그치고 봄은 한걸음 더 가까이 와 있다. 가까운 들녘에 나가 봄의 향기를 실컷 들이마시자. 번잡한 세상사는 잠깐 놓아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