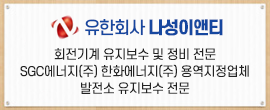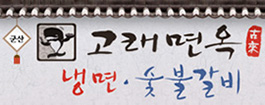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역 앞 굴다리 밑으로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은 7월 초순부터였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늘을 찾아 하나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굴다리 속은 지대가 조금 높아 장마 때도 습기가 없이 보송보송 하더니 더위가 한참인데도 서늘한 것이 제법 준비된 피서지 같다. 때문인지 공원 노숙자들이 이곳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기등살과 함께 불량배 단속을 피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난달부터 부녀회가 제공하는 무료 식당이 더 큰 원인 일 것이다. 군산 역전 구시장 입구 공터에는 오전열시부터 붐비기 시작한다. 시장상인 부녀회가 매일 하루 한끼씩 무료급식을 하면서부터다. 메뉴도 없고 급식숫자도 없다. 주로 해장국처럼 콩나물이나 시래기 국이지만 어떤 날은 육개장도 있다. 부인들 몇 사람이 처음 시작 할 때는 역사 앞에서 놀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단히 점심이나 한 그릇 대접한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배고파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말았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밥을 얻어먹으러 오더니 엉뚱하게 이번에는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와 취지가 영판 다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나는 그만 두겠소. 하고 물러날 처지가 아니었다. 삼례집 여주인이 별생각 없이 남는 찬밥 한 그릇씩 노인들에게 선심 쓰던 것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쳐다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이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시작은 엉뚱한 곳에서부터였다. 역사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언제나 갈곳 없는 노인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일테면 노천 양로원인 셈이다. 기차역이 생길 때쯤 기념 식수로 심었음직한 느티나무는 세월을 자랑하듯 무성한 가지와 잎이 크게 햇빛을 가리고 몸통은 양팔로 말아 잡아도 한 아름이 넘었다. 큰 몸집에 어울리게 무질서하게 뻗은 수많은 가지의 그늘은 한낮의 땡볕을 가려 주었고 앞이 훤히 터진 자동차 길로부터는 서해로부터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 더위를 식히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늘이나 시원한 바닷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항상 사람들이 벅적거리는 것은 약장사 따위가 몰려들어 심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심히 보면 여기저기 앉고 서성대는 노인들이 나들이를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눈 여겨 자세히 보면 전혀 아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안쓰럽게도 축 늘어진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허기에 지친 노인이 더 많아 보였다. 허허롭게 오목도 두고 장기판을 둘러싸고 앉아서 장이야 멍이야 하는 소리에 훈수도 겹들이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해가 중천에 오기 전 아침나절은 조금 났다. 집에서 먹고 나온 아침밥 기운일 것이다. 하지만 점심때가 지나면 완연히 눈에 띄게 다르다. 급수대로 가로 가서 쉴새없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효부 며느리 덕분에 점심값으로 천원짜리 몇 장 주머니에 넣고 나온 영감도 한둘이야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의 다가 도시락 없이 소풍 나온 아이들 같이 먼 하늘만 바라보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