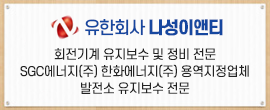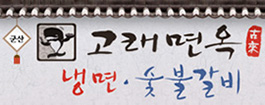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비럭질이 따로 있을까? 비위살 좋은 노인 하나가 시장 골목에 있는 삼례옥이라는 국밥 집 식당을 기웃거렸다. 수저를 입으로 우겨 넣든 젊은이 하나가 눈살을 찌프렸다. 보다못한 주인 여자가 침을 삼키는 창 밖의 노인을 보고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수저를 받아드는 노인을 보고 이번에는 눈살을 찌푸리던 젊은이가 한 그릇을 더 시켜주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소문을 들은 노인이 다음날도 또 식당에 나타났다. 유리창 넘어 얼쩡대는 노인들을 보면서 삼례댁은 할수 없이 또 식은 밥을 내놓았다. 고맙다는 인사보다도 땀까지 흘리면서 허겁지겁 밥 수저를 퍼 넣는 것을 보면서 안쓰럽기보다는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음날은 또 다른 노인들이 식당 문 앞을 얼쩡거렸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삼례댁은 좋은 일 한다고 밥 한 솥씩을 더 했다. 노인들이 자꾸 늘어났다.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할 때쯤 정말 다행히도 시장 부녀회에서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어설펐다. 얼굴에 짓게 화장까지 하고 목에 화려한 스카프까지 멋스럽게 맨 여자들이 신문지에 한쪽 얼굴이라도 날까하고 무슨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낯내기에 나섰던 것이다. 인상까지 쓰면서 화장한 얼굴로 손가방 들듯 밥통에 국통 하나씩을 양손에 어정쩡하게 들고 와서 광장에 늘어놓고 봉사 어쩌고 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또 잘난 여자들이 끼를 부린다고 비웃었다. 제깐 것들이 얼마동안 설쳐대고 까불다가 제풀에 그만 둘 것이 분명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 또 엉뚱하게 비웃는 쪽도 있었다. 넉살이 좋아 체면 따위 생각도 없이 처음부터 식당을 기웃거리던 몇몇 노인을 제하고는 제법 자존심을 부리는 쪽이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천환 짜리 한 장씩이라도 넣고 나오는 쪽이라고 할까? 순대국 한 그릇 값도 안되지만 집에서 아침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는 쪽들이었다. 어쩌다가 순대국 밥값이라도 아껴보려고 주춤 주춤 다가와 공밥을 얻어먹어 보았다. 하지만 기분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다. 멋 부린 여자들이 아무렇게나 준비도 없이 시작한 것이 맛은커녕 온기가 있을 리 없었다.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들고 오는 것도 다반사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김치는 시여 터졌고 콩자반은 물러서 이빨사이에 끼어 들었다. 맛은커녕 간조차도 맞지 않으니 욕을 먹게되어 있었다. 배부른 투정이 아니었다. 남이 먹다 남은 것이나 갖다 주는 것이 무슨 봉사냐고 비웃듯 수군거리는 것이 당연하게 들렸을 것이다. 이걸 밥이라고 주느냐?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이상하다. 모여들지 않으면 그만 인것을 아쉬워 받아먹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은커녕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이다. 더 웃기는 쪽도 있었다. 헛기침을 해대면서 뒷짐을 지고 방관자인척 하면서 빈정대는 쪽이 생겨나고 있었다. 얻어먹는데 아직 이골이 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거지냐? 비러 먹게? 하지만 그 거드름도 몇일을 가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넘어 봉사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자. 갑자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법 활기를 띄기 시작을 했다. 지금까지 주변을 맴돌면서 비웃어 대던 노인들까지 힐끔 힐끔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은근 슬쩍 줄 속으로 끼어 들고 만 것이다. 아니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눈치를 보면서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또 큰일이다. 준비한 밥보다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걱정할 때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