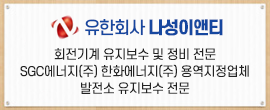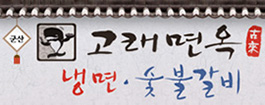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노숙자들의 웅크린 모습이 떠올랐다. 구멍가게에서 소주 한 병과 함께 안주로 새우깡 한 봉지를 샀다. 술이야 혼자보다 권하는 맛이 아니던가? 천천히 걸어서 고가 다리를 돌아서 굴다리 입구로 향했다. 밤에는 한번도 와 보지 않은 곳이다. 다소 두려운 생각도 든다. 주춤주춤 입구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퀴퀴한 냄새쯤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쾌적하다는 기분까지 든다. "젠장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시원한 곳을 놓아두고 마누라와 고장난 선풍기 싸움이나 하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스럽다. 지금쯤 라디오 점방에서는 장물아비 최가란 놈이 그것도 바람이라고 선풍기를 뺏어 돌리면서 마누라에게 외상값 내놓으라고 졸라대고 있을 것이다. "하이고 사장님!" 벌써 여러 번 본 노숙자가 달려 나와 인사를 한다. "잠자리가 어떤가 해서요." "고맙기도 하셔라. 밥 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제 잠자리까지 걱정을 해 주십니까?" "애를 봐주려면 끝까지 잘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는가? 여보게들 이리 와서 인사를 드리게. 봉사식당 사장님이 오셨네." 아무렇게나 누워 있던 노숙자들이 우르르 몰려 왔다. 기분이 좋았다. 사실 노숙자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환영해 줄줄은 미쳐 몰랐다. 마치 자기 혼자 봉사식당을 하는 같은 기분이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여기는 냉장고안이나 다름없습니다요" 그러고 보니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좋은 피서지를 두고 괜히 한증막 같은 좁은 가게에서 뭉기적거린 것이 후회된다. 까짓 돈이야 별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게도 공짜가 아니었던가? 가게를 내준 양조장 김사장 얼굴이 떠오른다. 다시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모두 잘되겠지." 만사 쉽게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좋다. 노숙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볍게 걸어갔다. "자 이리 오시오. 소주나 한잔합시다." 두리번거리던 하봉기가 노숙자 중에서 제법 양복을 갖춰 입고 얼굴에 때가 덜 낀 중년 노숙자를 불렀다. "저 말입니까?" "그렇소." "감히 어떻게 사장님과?" 허리를 굽히고 입으로는 어렵게 말하면서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하봉기가 앉아있는 옆자리로 다가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처음부터 노숙자가 따로 있소?" "알아주셔셔 사합니다. 신종걸 입니다." "받으시오" 하봉기는 갖은자의 오만으로 허리를 비틀어 반쯤 벽에 기댄 체 왼팔 하나로 소주병을 기울여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치고 있는 종이컵에 소주를 반쯤 따랐다. "황송합니다" "어쩌다 노숙을 하게 되었소?" "I.M.F가 원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