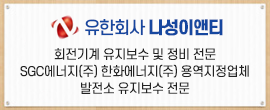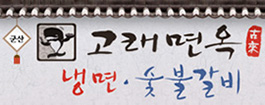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굴다리 밖의 가로등 불빛이 신종걸 사장의 유난히 검은 얼굴 위에 환하게 비추워진다. "온 세상 천지가 함께 당했는데 왜 유독 혼자요?" "외상을 가져간 놈들이 모두 그 핑계를 대니 난들 어찌 합니까?" "무얼 하셨는데?" "제재소지요. 톱이 두 대나 있었습니다" "저런?" 봉기는 진심으로 놀랐다. 제재소라면 얼마나 큰 사업인가? 자신이 하고 있는 라디오 점방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된다. 윙윙 돌아가는 톱 소리가 귓가로 들려 오는 듯 싶다. 평생 꿈이 제재소는 아니지만 그딴 큰 사업은 꼭 한번 하고 싶었다. 신사장의 얼굴을 새삼 다시 쳐다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별 볼일 없지 않은가? 일부러 비웃듯 목소리를 높여 주변을 보면서 큰소리를 쳤다. "누가 심부름을 좀 해야겠소. 소주를 몇 병 더 삽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깨 넘어 침을 삼키고 있던 중년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이 사람은 보험 회사 소장이었습니다" 신 사장이 일어나는 또래의 중년 노숙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마 둘이는 서로 알고 지내는 터였다.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리 오시오" "아! 그분은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교감?" "네 00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쩌다가?" "빚 보증이지요" "호 그래래요. 이리 오시오" "하, 감사합니다. 집 나온 지 처음으로 사장님에게 사람대접을 받습니다. 그려" 무릎걸음으로 다가온다. 떠그럴 최하가 교감이니 라디오방 사장은 어디 명함이나 내 놓겠는가? 그래도 모두 자신 앞에 무릎을 끓고 있지 않은가? 기분이 떨떨하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소주 한잔을 살수 있다는 자존심뿐이다. "자 마십시다" "황공합니다" "대인이십니다" "대성하소서" 연속극에 나오는 임금이나 듣는 소리지만 듣기가 거북하지 않다. 용꼬리 보다 닭벼슬이 낫다고 했던가? 노숙자면 어떤가? 자신은 엄연히 아직은 부도가 나지 않은 라디오 점포 사장이다. 신선 놀음이 따로 있나? 알딸딸 몇 잔 얼굴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밤은 여기서 잠이나 자자. 만나기 싫은 장물아비 최가 놈도 자신이 이곳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미친 자식 콱 불어버려?" 장물아비 주제에 외상독촉을 하는 최가가 괘심하다. 하지만 돌부리를 찰 수도 없고 제 놈이 지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등을 데고 길게 누웠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스르르 졸음이 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