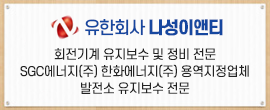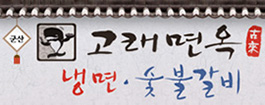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글 라대곤 / 그림 라지희 하봉기 사장은 이유야 어떻든 그 날밤 노숙을 했다. 물론 갈곳 없는 노숙자와는 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따지고 보면 한데 잠이야 똑같은 노숙일 뿐이다. 젠장 노숙이면 어떤가? 잠자리 편하면 그만이지. 최가 놈 등살에라도 더위가 지나갈 때까지는 이곳에다 잠자리를 펴는 게 옳을 것 같다. 최가의 낭패한 얼굴이 떠오른다. 슬며시 웃음까지 나온다. 달게 자고 아침에 털고 일어나 보니 숙면 덕분인지 한결 몸이 가벼워 진 것 같다. "사장님 오늘 메뉴는 뭡니까?" "나가봐야지." "복날인데 보신탕은 없습니까?" 멍석 펴주니 굿한다고 이제 봉사식당에 메뉴까지 요구하는 판이 되었다. 하룻밤이 만리 장성이라고 했던가 지난밤 함께 지낸 노숙자들의 얼굴이 밉지 않다. 길이 터진 탓일까? 하봉기 사장은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소주병을 들고 굴다리를 찾아와 노숙을 했다. 핑계야 장물아비 최가 놈 때문이라고 했지만 소주 몇 병에 임금 대우받는 신선 놀음에 도끼 썩는 줄 모른 것이 더 큰 원인 이었을 것이다. 한여름 굴다리는 노숙자들과 함께 하봉기에게 좋은 피서 지였다. 매일 소주를 사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상감마마 노릇 하는 하봉기 사장이나 어명을 받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는 신하들 놀음을 하는 노숙자 모두 행복했다. 닷새 째인가? 이제 상감 놀이도 이골이 났다. 허리를 더 굽히는 놈에게 소주 한잔 더 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어버렸다. 하봉기 사장은 점점 술을 더 많이 마셨다. 그 날밤 하봉기 사장은 꿈을 꾸었다. 고향마을 이었다. 귀순이가 저만큼 앞서 가고 있었다. 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이다. 입이 찢어지게 귀순이를 불러대며 쫓아갔지만 귀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죽자고 따라갔다. 귀순이는 간 곳이 없고 저 만큼 산이 보인다. 고향마을이다. 금강이 끝나는 오성산 밑이다. 그러고 보니 고향 마을에 와 본지도 오래다. 하봉기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만 농토가 적어서 남에집 허드레 일이나 아니면 목선을 타고 금강으로 나가 새우나 잡았다. 아버지는 봉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 봉기의 태몽은 망둥어 때가 어머니 치마 가득 뛰어올라 왔다고 했다. 새우라면 모를까 망둥어가 이상해서 오성사 스님에게 해몽을 해달라고 했더니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그놈 망둥어처럼 뛰어오를 테니 잘 키우라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봉기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초등학교 육학년 때였다. 마을에 광목이 한 필 상품으로 나왔다. 새마을 운동으로 퇴비증산을 하는데 일등상품이었다. 필요한데 쓰라고 나왔지만 스무집이나 되는데 광목 한 필이 나왔으니 찢어서 나눌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 갖기로 했다. 다른 집은 모두 어른 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봉기를 내 보냈다. 아버지의 뜻에 보답하듯 봉기가 선(選)짜가든 제비를 뽑아 들어 의기양양하게 광목 한 필을 어깨에 메고 왔다. 아버지는 기뻐서 봉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재수 있는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입이 함박만하게 찢어졌다. 아버지는 봉기에게 아무리 바빠도 밭일 따위로 괭이나 낫을 들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