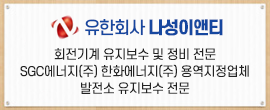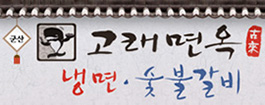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아......아 순간 이상한 신음 소리에 소름이 돋는다. 바람소리 따라 들리는 가냘픈 흐느낌 소리 같았다. 아파서 끙끙대는 소리도 같고 어찌 들으면 숨죽여 우는 소리 같았다. 아니 암내난 암 고양이의 울음처럼 음산했다. 등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끼쳐 왔다. 산 고양이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일어나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등을 대고 있던 묘지 뒤쪽에서 나는 소리 같다. 허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돌아가 보았다. "헉!"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엉키어 있었는데 달빛 속에 환하게 비추어진 두 사람은 벌거숭이었다. 한 몸이 되어 열심히 정사를 하고 벌리고 있는 두 사람은 봉기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는 여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봉기는 급히 소나무 그늘 밑으로 몸을 숨겼다. 고막 속으로 윙윙거리는 소리말고는 아무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아!' 순간 봉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튀어 나왔다. 엉켜 있던 두 사람이 떨어지면서 밑에 깔려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시커먼 사타구니가 달빛에 쏟아지듯 환하게 들어 났다. 봉기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던 봉기는 또 한번 놀랐다. 마을 가운데 살고 양조장 집 김사장이야 벌써 보았지만 그녀가 귀순이 어머니 무당인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날밤 봉기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무당의 시커먼 사타구니가 천정 가득 쏟아져 내려왔다. 다음날도 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귀순이에게 큰 죄를 진 것만 같다. 아니 귀순이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온다. 얼마 아니면 학도 호국단장 선거가 있는 데 큰일이다. 한데 왜 자꾸 그녀의 어머니 사타구니가 떠오를까? 달빛 속에 보인 그녀의 사타구니는 너무 근사 하다 귀순이 것도 똑같을까? 양조장 김사장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진다. 그 날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이조 판서 묘로 가서 소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이제 귀순이가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봉기가 숨어서 보고 있는 것을 눈치 챘을까? 실망으로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들이 나타난 것은 보름 후였다. 그 날 밤은 그믐으로 칠 흙처럼 어두워서 그녀의 사타구니를 볼 수는 없었지만 암 고양이 소리는 여전했다. 그들이 만나는 밤은 이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다. 불청객이지만 어둠 속에 반짝이며 지켜보는 봉기의 눈이 있었다. 아니 봉기가 더 기다리는 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정사를 구경하는 밤은 귀순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다만 날이 새면 또 귀순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 왔다. 귀순이의 나체를 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마침 전 날밤 질펀한 향연을 보고 잠을 설친 봉기는 갑자기 귀순이 생각이 나서 그녀 집 담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