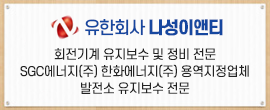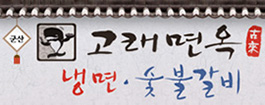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사장님, 일어나십시요. 식사시간 다 되었습니다" 집에서 들고 나온 담요를 둘둘 말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하봉기 옆에서 어느새 말끔히 세수까지 하고 나타난 신사장이 보건체조 하듯 허리를 비틀면서 말했다. 공중변소 세면장을 먼저 쓰려면 아무래도 아침 잠을 줄여야한다. "벌써 아침인가?" 어젯밤 좀 과하게 마시기도 했지만 막 일기 시작한 찬바람 덕분에 시원한 잠자리에서 단잠을 잔 모양이다. 어깨까지 끌어올린 모포를 털고 일어나 긴 기지개를 켰다. 몸이 무겁다. 이대로 더 잤으면 좋겠다. 사실 찬바람이 나면서 굴다리는 좋은 잠자리는 아니었다. 하봉기야 이제 더위가 갔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꼼지락거리기가 싫지만 억지로 털고 일어났다. 오늘은 할 일이 많다. 무료급식소도 나가 봐야겠지만 장물아비 최가와도 담판을 지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생각 같이 일이 잘 끝나주지 않았다. 최가가 반대로 마나주지를 않는 것이다. 도둑질로는 이골이 난 최가가 순수히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 지금쯤 최가는 최가대로 무슨 끙끙이 속을 챙기고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며칠 더 이곳 노숙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편하던 잠자리가 날씨가 추어지면서 바닥이 시리고 시원하던 바람이 살 속을 파고든다. 가장자리로 모여들던 노숙자들이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데 더 큰 문제가 생겨 버렸다. 굴다리 속이 비좁아 서로 자리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각설이 패가 모여들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노숙자들만 신문지를 깔고 누웠을 때는 많이 넓다 싶었다. 한데 찬바람과 함께 각설이 패까지 잠자리로 터를 잡으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다. 각설이 패들은 염치도 없이 잠자리 터까지 넓게 잡고 누웠다. 몸에서 나는 악취말고도 득실거리는 이 때문에도 아직 때가 덜 묻은 노숙자들은 언짢은 눈으로 조금씩 멀리 피해서 누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점점 밖으로 밀려나 올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노숙자들의 잠자리는 점점 더 좁아졌다. 성질 급한 노숙자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체면 없는 각설이패가 얼시구 물러날 리가 없다. 자연히 티격 태격 싸움이 붙었다. 싸움의 발단이야 잠자리 때문이라고 하지만 각설이 패와 노숙자간의 격은 아예 처음부터 달랐다.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고 모양새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말고는 애초부터 단 한가지도 일치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 노숙자는 깐에 자부심이 있었다. 비록 지금의 처지가 곤궁하여 굴다리 잠을 자고 봉사 식당에서 하루 한끼의 식은 밥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고 하지만 언감생심 거지 따위들이 동족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된 다는 주장이었다. 아니 애시당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장타령을 업으로 해서 남에게 빌어 먹고사는 거지 놈들이야말로 기생충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