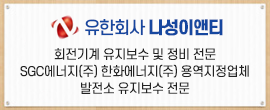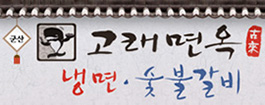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교육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어”
우리배움터 1기 학생회장인 황성례(84) 할머니가 한글날을 맞아 막내딸 이정신(52 우리배움터 교사)씨의 손을 잡고 새롭게 이전한 학교를 방문했다.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아파서 손해, 잃어서 손해. 눈에는 맨 시계만 보인다. 이 귀퉁 저 귀퉁 찾아보아도 없다. 시계를 잃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며느리한테 선물 받은 시계인데 어느 기회를 보아서 말을 해야 되겠지. 그거 아니라도 팔월 명절은 돌아오는데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은 우울하다. <일기 1994년 9월 7일 진달래 2반 황성례 > “이게 정말 내가 쓴 일기여?” 19년 전 자신이 쓴 일기를 읽고 황성례(84) 할머니는 어린아이마냥 신기해했다. 21년 전 어찌해서 우리배움터에 오게 됐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황 할머니는 한글날을 맞아 막내딸 이정신(52 우리배움터 교사)씨의 손을 잡고 새롭게 이전한 학교를 방문했다. 자신이 배우던 곳에서 막내딸이 교사로 일한다는 말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선 것. 황 할머니는 새롭게 단장한 학교 내부를 둘러보고 앨범을 뒤적이면서도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앨범 속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20여 년 전 황 할머니는 곱디고운데 앨범을 넘기는 황 할머니는 백발의 노인이 돼 있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절 한글을 배워둔 덕에 일기도 꾸준히 썼고, 가끔 편지도 쓰게 됐다. 교회에 가선 당당히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무료한 시간엔 책을 베껴 쓰면서 심심함을 달래기도 한다.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한 생활이다. 황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 당한 설움이 어디 한 두 가지겠어. 눈을 뜨나 감으나 마찬가지지. 아이들 이름을 구별할 줄 아나, 외상 장부를 볼 줄 아나, 돈을 셀 줄 아나?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였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글을 몰라 어디 가는 버스냐고 묻는 게 두려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던 황 할머니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는다. 자식이 공부하는 학교에 찾아가고 싶어도 행여 못 배운 엄마가 실수라도 해서 자식에게 상처를 줄까봐 가지 못했다. 누가 이름 석 자 전화번호만 적어 달래도 이 핑계 저 핑계 거짓말을 하느라 얼굴 붉어진 일도 많았다. 공부하다 답답하면 빚이라도 내서 실력을 사고 싶다는 푸념도 했다. 글을 모른다는 건 그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픔을 느끼는 일이었다. 그렇게 한글을 몰라 답답했던 황 할머니는 환갑을 훌쩍 넘겨서야 한을 풀게 됐다고. 남편과 자녀들 몰래 우리배움터를 다니면서 조금씩 한글에 눈을 뜨게 됐다. 복습을 해야 실력이 늘 텐데 숨기고 있자니 영 답답했다. 이후 공부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틈만 나면 딸과 손주들을 졸라 복습했다. 문제를 풀다 잘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공부욕심이 대단했던 황 할머니는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돼 반장과 학생회장을 맡아 어린 교사와 나이 든 학생들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 황 할머니의 남편이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병수발에 장사와 살림까지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는 데도 황 할머니는 하루도 빼지 않고 출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한글을 깨치는 즐거움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그 즐거움 덕에 병수발도 힘들게 여기지 않았던 것. 황 할머니는 “한글 배운 덕분에 한 20년 즐겁게 보냈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연로한 탓에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행동도 느려져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황 할머니의 딸 이씨는 “엄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글은 삶에 지쳐 외로움과 싸우던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적을 만들어 내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할머니는 “한글을 배우는 것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볼 수 있는 광명 같은 큰 기쁨”이라면서 “우리 막내가 나 같은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한다니 기쁘다”며 엷은 미소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