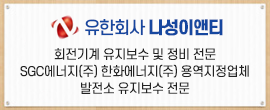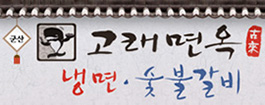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교육
‘용기내 배우고 여생을 자신있게’
“우리 배움터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못 배운 설움을 토해내고 인생의 한을 풀어내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
“우리 배움터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못 배운 설움을 토해내고 인생의 한을 풀어내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분들이 모여 웃고 우는 수다방이기도 하구요.” 정미선(41) ‘우리배움터 한글학교’ 교장의 설명이다. 한글반포 567주년을 맞은 지난 10월 9일, 공휴일로 재지정돼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된 한글날을 맞아 지난달 옛 삼학동사무소로 이전한 우리배움터를 찾았다. 우리배움터는 군산시 최초로 문해교육을 실시한 곳으로 1992년 5월 금광동 모 상가 2층에 문을 열었다. 한글을 몰라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우리’와 ‘배움의 터’를 합해 ‘우리배움터 한글학교’로 개교했다. 매일 150명의 학생들이 8개 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쉴 새 없이 진행됐고, 자원봉사 교사들과 운영위원들이 힘을 합해 즐거운 배움터가 됐다. 또한 배움에 그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교훈아래 1997년 1월부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업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개교이후 2012년까지 한글중급과정 500여명이 수료해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뜨게 돼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 누구보다 배우기를 원하지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만 싶은 어르신들. 그래서 학교명패에 ‘우리배움터’라고만 명시할 뿐 ‘한글학교’라고 덧붙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바람대로 학교 입구에 ‘우리배움터’라고 명패를 붙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그마저도 사라졌다. 학생 중에 누군가 자신이 이곳에 다니는 걸 숨기고자 가져갔던 것. 이를 보고 정 교장은 감히 어르신들께 “못 배운 게 무슨 죄느냐”고 말할 수가 없게 됐다. 다른 이들은 쉽게 말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못 배운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한글을 모른다는 죄로 남편에게도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제대로 해 보지 못했고, 자녀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질 수가 없었다. “글도 모르는 게 사치 한다”는 소릴 들을까봐 옷 한 벌 사 입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친구집이나 친정엘 찾아갈 수도 없었던 어르신들. 무엇보다 돈을 셈 할 줄 모르니 생활하는 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무엇을 하든 눈치로 알아 체야 하니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른 이들보다 피로가 곱절로 밀려왔다고. 우리배움터를 다니면서부터는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다.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쓰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손수 편지를 부치고, 손주들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으니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만 같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이런 새로운 삶을 꿈꾸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오전오후 4개 반으로 나뉘어 배움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그동안 열악한 학교환경으로 배움을 중단했던 어르신들도 이번 이전으로 인해 다시 학구열을 태울 수 있게 된 것. 가파른 계단을 오르지 못해 공부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르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학교로 들어오고, 새 책상과 새 칠판으로 채워진 교실에 앉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 교장은 “군산에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55곳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도 배우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음지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 한글에 도전하고, 여생을 자신 있게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