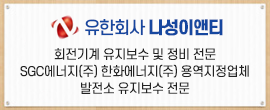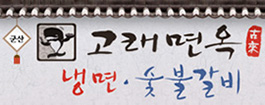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문화
바늘과 실로 만들어가는 일상
‘안상상’ 브랜드로 활동하는 안영숙 전통공예 예술작가

오색빛깔 찬란한 전통자수의 향연
예술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소통케 하는 힘을 가졌다. 자수의 오묘한 색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전통자수 기법을 예술로 풀어내고 있는 지역예술가 안영숙 작가를 만나 작품세계와 철학을 들어봤다.
“물감과는 사뭇 다른, 실과 빛의 조화에서 오는 색의 매력에 빠져 하루 몇 시간씩 정자세로 앉아 자수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한 올 한 올 꽃잎이 채워지고 새가 날고 있으며 또 다른 실들이 한 가닥 한 가닥이 모여 백호가 돼있는 등 다양한 수를 놓은 수보와 천을 이어 만든 조각보 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현대적 감각과 색채로 전통자수를 예술로 이어가고 있는 안영숙(49) 작가의 말이다.
최근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는 오색빛깔 찬란한 전통자수들의 향연인 ‘우리나라 꽃이 피었습니다’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을 황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꽃과 새, 동물 등을 전통자수로 표현한 복주머니, 흉배, 안경집, 돌띠, 혼서지보, 무지개보와 8폭의 초충도 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주제로 전통자수공예와 규방공예 작품 등을 선보이며, 점점 사장돼가는 한국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안 작가는 “보이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고 관심 밖의 일이 되므로 우리 전통문화를 자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전통문화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하며, 아울러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근대역사거리에서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가 트렌드처럼 예쁘게 꾸며진 모습에 가려 미화되는 것이 우려돼 이번 전통예술을 전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작품 중 8폭의 초충도(草蟲圖)가 단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섬세하고 뛰어난 회화성을 지닌 작품 초충도는 다양한 꽃과 풀, 곤충·파충류가 어우러진 정경을 수놓은 병풍용 자수로, 특히 풀벌레의 작은 더듬이나 발끝에 한 치의 떨림도 용납되지 않는 엄중함이 깃들어 있어,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숨을 불어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미물인 풀벌레조차도 그 존재를 충분히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안 작가는 “서양자수(프랑스 자수)는 대중의 관심과 저변이 확대돼 있지만, 한국전통자수는 그러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병풍용으로 수놓은 8폭의 초충도는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지만 병풍으로 마무리 지으면 일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창고행일 것 같아 병풍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나는 미술인이다’라는 생각으로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 것 같았다던 안 작가는 “미술을 평생 친구처럼 두고 살았지만 크게 열정을 불태우진 못했다”며 “유화를 해도 동양미가 흐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8년 전 물감과는 다르게 색실의 꼬임과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실과 빛의 조화에서 오는 색의 매력에 빠진 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의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과 2020년 전북도 공예품대전 등에서 수상한 안 작가는 “지나고 보니 이 길이 내 길이었던 것 같다”며 겸연쩍이 웃었다.
마지막으로 안 작가는 “성장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정지된 것은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전통예술 또한 답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상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작가명이기도 한 ‘안상상’이란 부캐릭터로 대중에게 기억되길 원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상상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 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안상상은 상상에 그치지 말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미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다”고 수줍게 말했다.
‘안상상’은 현재 규방공예와 전통자수를 연구하고 작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공예 작가로서, 전통자수를 새롭게 변혁시켜 생활 속의 예술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스러운 전통자수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전통예술을 접목한 ‘군산 스토리’가 스며들어 있는 현대적 작품들을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어서 그녀만이 가진 멋스러운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