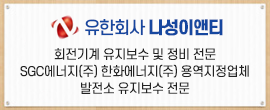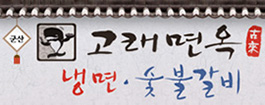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스포츠/건강
20대 여성 관장이 떴다!!!
‘국기인 태권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0대 태권낭자가 나서 화제이다. 그 주인공은 조촌동 소재 한국체육관 박현미(27) 관장.
‘국기'인 태권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0대 태권낭자가 나서 화제이다. 그 주인공은 조촌동 소재 한국체육관 박현미(27) 관장. “선수로서는 최고가 되지 못했지만 가르치는 아이들을 세계 선수로 육성하겠다. 후배 선수들에게는 여자관장으로서 본을 보이겠다.” 박 관장은 이런 포부 속에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념 없다. 평소의 박 관장은 주위 20대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다. 그러나 하얀 도복을 입는 순간 합기도 2단, 태권도 5단 합이 7단인 ‘강한 여자’로 불린다. 우먼파워로 박 관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겼던 체육관장에 당당히 여성이라는 명암을 내걸고 후배육성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태권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자선수들이 그 진로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녀의 관장으로서의 길이 여자후배들에게는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다. 박 관장이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나가면 울고 들어오는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였다. 특히 셋 딸 중 한명은 강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강력한(?)권유가 박 관장이 체육관에 첫 발을 딛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시작한 태권도 길은 박 관장의 삶을 180도 바꿨다. 성격은 물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선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박 관장은 도 대표에서 각종 수상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 나가 핀급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는 수준급 실력의 소유자다. 그러나 박 관장은 도 대표 탈락의 쓴 맛과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가 좌절되자 선수로서의 생명도 서서히 막을 내렸다. 그러던 중 용인의 한 여자관장을 만난 후 비록 박 관장은 선수가 아닌 아이들을 육성하는 사범으로 그리고 현재 관장으로 그 꿈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작한 지도자의 길. 여성이라는 편견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고 남몰래 눈물도 많이 삼켰다고 한다.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 노력만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조촌동 한국체육관을 운영한지 6개월. 지금은 그 편견과 불신을 격려와 믿음으로 보답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배려와 섬세함이 너무 좋다는 반응이다. 박 관장의 어린 제자들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동초․김준호 선수)을 따는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박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훌륭한 선수로 육성하는 것이 제 소망이며 동시에 여성관장으로서 여성태권도가 발전하는데도 큰 보탬이 되고 싶다”며 “오늘도 내일도 땀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찬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