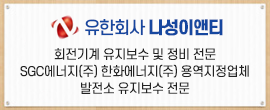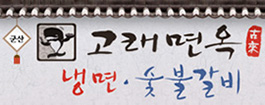메인 메뉴
콘텐츠
스포츠/건강
금남의 벽 깨고 환자의 수호천사로 우뚝
한국병원 간호사 조장환(35)씨는 금남의 벽을 깨고 당당히 남자간호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간호사는 여자밖에 없나?”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나 다큐에 출연하는 간호사의 모습은 대부분 여성으로 비춰진다. 문화동에 있는 한국병원에는 32명의 간호사가 있다. 그중 유일한 청일점인 조장환(35)씨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군산에는 대략 3명 정도의 남자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의 전체 간호사의 0.5%도 안되는 수준이다. 직업에 대한 남녀구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여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분야. 그러나 조 씨는 ‘금남의 벽’을 깨고 2006년 군산간호대에 당당히 입학했다. 간호사 지망생 이야기에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동기들도 중간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그는 이를 악물고 간호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며 꿈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했다. 처음 간호사를 결심한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간호사에 대한 남다른 사명의식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취업 잘 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간호대학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주변의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팔에 스스로 주사바늘을 꽂으며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첫 직장은 서울에 있는 한 화상병원.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간호사를 하게 된 단순한 그의 가치관이 변한 건 2010년 한 외국인 노동자 환자를 만나고부터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환자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꽤 오랜 병원신세를 졌다. 조 씨는 같은 타지생활을 한다는 공통분모로 환자와 보고 싶은 가족 얘기, 고향 얘기를 나누며 정이 들었다. “생계를 위해 팍팍하게 살아 온 외국인 환자는 퇴원 후 제 진심어린 조언이 통했는지 신앙도 갖고 여가시간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연락을 했어요. 아픈 몸을 간호한 것보다 훨씬 뿌듯했죠” 그 후 일을 하다 보니 아픈 환자들을 정성껏 간호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그는 4년 전 군산으로 내려와 한국병원 수술실 어시스트로 일하고 있다. 가치관도 180도 달라졌다. 환자를 대할 때 진심어린 조언과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부름이 있으면 쉬지 못한다. 조씨도 간호생활 7년간 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목숨이 오고가는 수술실에서 하루종일 긴장을 놓지 않고 근무하면 머리가 핑 돌 때도 있었단다. 하지만 그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보람이 힘든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조 씨는 “한달 전 한 환자분께서 퇴원 후 ‘정성껏 간호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편지를 건넸다”며 “정성이 담긴 편지 한 장은 쌓인 피로가 싹 가시는 특효약”이라고 말한다. 오늘도 그는 출근길에 마음 속으로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시작되는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되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