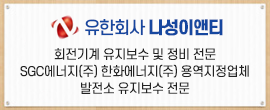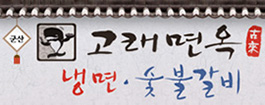째보선창. 군산의 닉네임이다. 비린내 물씬 나는 동부 어판장을 끼고 시내에서 흐르는 물줄기 개천이다. 이를 가리켜 사람의 윗입술이 찢어진 언청이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누구에 의해 언제 부터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째보선창’은 군산의 대명사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개항 이전은 금암동 선창가 일대에서 포구로부터 시작된 군산항은 순수한 어항이었다. 금강하구에서 잡는 생선을 비롯, 칠산어장, 전남 신안 앞바다, 연평도, 동지나, 남지나 해역까지 가서 잡아오는 조기, 갈치, 병어 등 다양한 어종의 집결지가 군산항이다.
이곳 어판장은 조금 때면 선창가 배들은 오색의 만선 깃발을 날리는가 하면 부둣가에는 생선상자로 산더미를 이룬다. 조금의 기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가 하면 부둣가는 물론, 봄부터 초가을 까지는 시가지 주점 골목이나 큰 도로변에는 술취한 어부들이 팔자 좋은 잠자리가 된다.
군산항이라는 항구가 개항되면서 동부어판장 앞에는 선박의 길잡이 빨간 등대하나가 1919년에 설치됐다. 이 등대는 단순한 선박의 등불만이 아닌 군산항의 낭만을 대변해 주기도 했다.
군산항 등대. 이 등대와 선착장, 어판장 등 째보선창을 무대로 문인들은 시와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1백여 년 수난의 역사 속에 문화예술을 꿈꾸는 군산항은 익어가고 있다.
문화예술을 머금으면서 오늘을 지켜온 군산항은 너무도 초라한 풍광의 짚 시처럼 느껴졌다. 그토록 성시를 이룬 어판장과 즐비한 주막집, 선구상회, 어선, 어구, 공장도 모두 자취를 감춰 버렸다.
심지어는 어민을 대상으로 한 여인숙은 진적에 문이 잠겨있고 어선관련 업소들은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허허벌판이다. 부둣가는 선박 폐선, 소형 화물운반선, 갈매기만이 날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북풍한설이 춤추며 날뛰는 무희의 치맛자락 바람만 날리는 형상이다. 필자는 중학교 시절 째보선창가 노부부가 운영하는 ‘고군산 여인숙’에 하숙을 하면서 째보선창다리를 하루면 몇 번씩 걸어 다니며 보낸 그 시절은 향수어린 곳이기도 하지만 꿈을 키운 자리이기도 하다.
최근 1시간여에 걸쳐 째보선창 일대를 걷는 사이 길가는 사람은 선창가를 지나는 주부 한명이 전부다. 나를 본 째보선창은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가, 왜 나를 이렇게 버려 둡니까”하는 항의와 절규의 쟁쟁한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 서려졌다.
갈매기 몇 마리는 폐선 돛대에 앉아 서해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민들의 먹거리 생존터가 아닌 우리들이 향연을 펼치는 보금자리임을 보여주는 거 같아 등대를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는 순간 가슴 뭉클했다.
군산시는 어판장에 수제맥주공장과 다른 시설물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나 언제 실현 될지는 알 수 없으며, 그것만으로는 기대충족이 어려우리라 보여 진다.
제대로 하려면 째보선창을 포함한 동부어판장 등 금암동 일대를 재생의 수단으로 회생시켜 낭만이 춤추는 거리를 조성해야하는 마음 간절하다.
군산의 대명사 ‘째보선창’은 오늘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면서 회생의 절규하는 숨찬 목소리는 등대가 있는 금강물에 호소하고 있다. 오늘밤도 등대는 희망의 안내자 불빛을 날리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