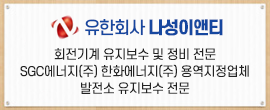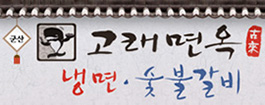제12회 여걸 백효기 여사1
백효기 여사(1908~1990․신민당 군산지구당 부위원장)는 전북의 여걸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서린 백효기 여사다.
백 여사와는 1967년 6.8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첫 인연을 맺었다.
6.8선거가 마무리되면서 1968년 전북일보 기자로 입사함에 따라 자주 뵙지를 못하고 어쩌다 들르는 정도였는데 1990년 12월 19일 타계하셨다. 여생을 마치신 따님 댁에서 출상하는 날 나는 만장의 뒤를 따르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가를 던져주신 그 심정을 담은 글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고의 글을 쓰면서 그토록 사무친 하얀 눈송이 꽃을 보는 울렁이는 마음으로 1992년 1월 ‘내가 만난 백효기 여사’에 대한 글을 쓴 내용을 또 한 번 세상에 알리고 싶다.
오늘의 김철규가 있고 꿈을 키워주신 백효기 여사는 약사로 일생을 마치면서 기개 높은 기상을 심어주신 정신은 최소한 나에게는 영원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백 여사는 모든 세인들에게 지조와 절개, 인생철학을 심으셨다. 나는 1993년 6월 3일 두 번째 발행하는 ‘흐르는 강물을 누가 막겠는가’의 칼럼집에서 ‘내가 만난 백효기白孝基 여사’라는 제목으로 밝힌 내용을 전문수록 하고자 한다.
◎눈발이 탐스럽게 휘날렸다. 마치 상여 뒤를 따르는 무수한 만장들이 펄럭이는 것과도 같았다.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다. 그 하얀 길 위로 영구차가 서서히 미끄러지듯 상가를 떠났다.
많은 조객들과 함께 그 뒤를 따르던 나는 눈발이 그칠 것 같지 않은 잿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왕에 내린 눈이라면 더 하얗게 지상을 덮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경암동 상가를 떠난 영구차는 평민당 군산시 당사에서 멎었다. 평생을 야당생활로 일관해온 고인인데 당사 앞을 바람처럼 그냥 스쳐갈 수 없다는 중론 때문이었던 것이다.
노제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눈발은 계속해서 펄펄 날렸다. 평소 깨끗하게 살았던 그 영혼을 보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 화신이 우리 앞에 눈 꽃송이로 나타났는지 모를 일이였다.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백효기 여사는 이승을 그렇게 떠나갔다. 1990년 12월 19일. 장지인 옥구군 임피면 봉황공원 묘지까지 따라갔던 나는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명산시장에서 ‘백약국’을 운영하면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호흡하며 지내시던 백 여사의 고결한 인품이 자꾸만 떠올랐다.
더욱이 고달프고 외로웠던 말년의 생활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었던가를 생각하면 병환 중에 더 찾아가지 못했던 회한이 가슴을 찔렀다.
나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진실한 삶의 길을 인도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꿈을 키워주었던 은인으로서 영원히 잊지 못할 등대 같은 분이였다.
김판술 선생을 따라 내가 처음 만난 것은 1967년 6.8총선 때였다. 그러니까 26년이란 세월을 통해 나는 백 여사가 야당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러러보았고 백 여사는 내가 언론인으로서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모습을 빠짐없이 주시할 만큼 두터운 인연을 맺어왔었다.
내가 알고 있는 백 여사를 한 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그는 여걸이었다.
인자하면서도 결단력이 강했고 생활은 검소하기 그지없었다. 역대 홍일점 도의원을 지낸 그는 유창한 언변과 논리적인 사고로 언제나 불의를 멀리한 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