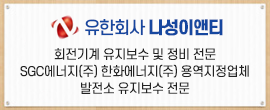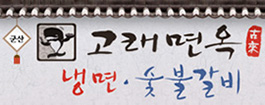제17회 잊을 수 없는 5.18 참상
아침 일찍 일어나 도청 앞 광장을 보는 순간 전장 터 군인들을 보는 것 같았다.
민간인은 하나도 볼 수 없고 군인차량들만 오고간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피 끓는 함성들만 진압 군인들의 만행이 잠시 잠재울 수 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함성을 틀어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노가 솟구치기도 했다.
도청 앞 광장을 지나 금남로 거리를 보기도 어려웠다. 어느 곳에서 군인들이 나타나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인도 한쪽으로 걸어가면서 상가나 주민들의 동향을 살폈으나 살벌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도청 옥상에서 쏘는 총소리만 가끔 들리고 있다.
상무관 시신들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린다. 더는 취재가 어렵고 가는데도 어떨지 몰라 일단 광주를 빠져 나가자고 했다.
우리는 숨죽인 듯 온 길인 담양, 남원으로 해서 전주로 돌아온다.
담양으로 가는 광주외곽에 주둔한 검문소에서 몇 번의 검문을 당했지만 제지당하지 않고 전주 회사에 무사히 도착했다.
박규덕 편집국장께 상황설명을 하는 순간 박 국장은 “상무관이 피투성이란 말인가”고 되물어 처참한 장면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나라가 무슨 꼴인가, 전두환, 이사람 살인마 아닌가” 하며 노기에 찬 모습이다. 평소 말수가 적으신 박 국장은 “편집이 문제다”라며 한숨을 크게 내쉰다.
내 책상에 돌아와 동료기자들에게 보고 느낀 상황설명에 바빴다.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어느 선생이 썼다는 산문시 한편을 받아 왔다. 시 내용은 시민 학생 총살 등 관주의 당시 참상을 그려낸 내용들이다. 책상 서랍 한쪽에 잘 보관해 놓았다.
퇴근 하자마자 회사(당시 전북일보 전주시 고사동 소재)부근 막걸리 집인 태봉집으로 몇 명이 몰려갔다.
요지는 잔인무도한 총살이 난무했다는 사실과 전남경찰국 상무관에 널려버린 시신들이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관에는 태극기로 덮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와 계엄령 철폐 등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며 항쟁을 벌이다 숨진 청년, 학생, 무고한 시민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가눌 길이 없었다“는 실상을 털어놓았다.
자리를 같이한 선후배동료들은 서로 한잔씩 사겠다고 하여 결국 3차까지 가는 기백을 보였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뒤 광주에서 가져온 산문시를 찾았으나 안 보였다.
설합을 몇 번씩 털어보아도 없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중간에 그 시를 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술자리로 가져가 보인 후 제대로 챙기질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 내 잘못으로 돌리고 말았으나 못내 아쉬움은 지금도 남아있다.
40여년이 지났어도 5.18역사성의 명작으로 평가와 함께 ‘얼마나 소중한 시 한편인가’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을 저리게 한다.
신문기자라는 책무도 있지만 사회부 사건기자라는 점에서 기자의 사명감이 발동하여 삼엄한 5.18사태의 현장을 보았다는 것은 생애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느껴진다.
5.18당시 시체검안을 한 광주지검 담당검사는 전북 김제 출신 임휘윤 검사(고인)다. 임 검사는 전주지검 초임검사로 내가 법조 출입할 때여서 임 검사를 잘 알고 지내는 처지였다.
그 후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겨으나 5.18당시 당직검사로 시체검안을 하게 된다. 평소 아는 처지인지라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 만날 기회가 있어 당시 상황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임 검사는 시체검안은 의사입회아래 사망에 이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시신들은 “눈뜨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들려준다. 생각하면 몸서리 쳐진다고 한다.
임 검사는 남성고, 서울법대, 사시 12회, 서울 중앙지검장, 부산고검장 출신으로 전북이 낳은 인물이며 5.18현장 증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