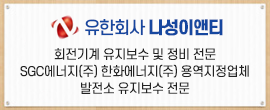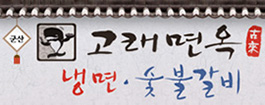제30회 사회부 기자의 예리함은 생명이다 1<김시훈 사건의 예>
일간 신문사 사회부는 편집국의 꽃이다.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체육부 등 다른 부서는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취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부는 일상적 사회의 광활한 분야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취재 폭이 넓다.
특히 경찰이나 법조 기자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넘나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사회적 정보는 경찰과 검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의 수습기자시절에는 각 분야를 취재원으로 했으나 수습이 끝나면서는 사회부로 배속되면서 사건담당기자 생활을 시작한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자정을 넘을 때까지 경찰을 지켜봐야 한다.
특히 사회적 이목을 받거나 대형 사건을 비롯, 극비에 추진되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어느 매스컴의 기자보다 앞서는 취재를 해야 하는 것은 기자로서는 숙명적인 일이다.
만약 타사에서 먼저 보도를 하는 날이면 취재기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신문의 속보성과 기민함의 처지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담당기자는 민첩함과 정보를 알아내는 기민한 센스, 취재부서원들과의 인간적 관계 등 다양한 기법을 써야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비상한 취재 경쟁을 벌인다. 따라서 사회적 중대사건을 취재하여 보도를 하는 것은 특종기사가 되지만 대단한 민첩한 기자로도 평가받게 된다.
석간의 경우는 새벽부터 1차 마감시간인 오전 11시까지는 정신이 없을 정도였으나 발행시간을 조간으로 바뀌면서는 하루 종일 오후 윤전기 돌아가지 직전까지인 6시까지 사건사고 체크를 해야 한다.
그 뒤로는 동료 아니면 출입처 요원들과 함께 술한잔 마시러 가는 시간이다.
내 경우는 자정인 12시 전후하여 맥주 5-6병 오징어 한 마리 사들고 경찰청 상황실을 찾는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197-80년대는 가능했음) 목이 칼칼한 참에 시원한 맥주한잔 하면 졸던 졸음도 가시고 근무에 더욱 열심들이다.
그리고 나면 자정을 넘어 1-2시경에나 귀가하는 시간이다. 겨우 3-4시간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5시경에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과를 몇 년을 하고 난 후 법조출입기자로 출입처를 옮기게 된다.
법조출입은 경찰출입 때에 비하면 근무시간 외에는 특별한 사건취재가 아니면 크게 바쁜 일이 없는 편이라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러자 1981년 6월24일 밤 11시경 전주시 효자동 자림원 앞 고갯길 고추밭에서 30여 군데를 난자당한 살인사건이 발생, 검찰에 보고 됐다. 일명 김시훈 사건이다.
경찰 기자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 직접 취재에 나섰다. 곧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수사본부가 자림원에 차려져 전주지검 당시 신 모 검사가 수사 지휘검사다.
사건발생 보도는 전북일보 1면 탑 기사요 해설기사가 나갔다. 이날 오후 수사본부에 나가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했다.
검사를 포함한 경찰 수사요원들 대부분이 공범행위라는 견해들이다. 이에 나는 결단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나에게 어림없는 추측이라며 수사진들의 고생이나 잘 부탁한다는 것이다.
두고 보세요. 범죄인들의 심리가 공범은 난자를 못하며 단독범행은 난자를 하여 완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평소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지켜봄은 물론, 당사자에게 조사과정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는 편이다.
그런가 하면 대형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은 현장취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들의 판단이나 지휘검사 판단보다도 앞서는 예리한 판단과 추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신문기사를 보고 수사진행에 참고 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자의 사명감 때문이다. 때로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취재진들과 함께 한통 쏘는 날이다. 사건의 전말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