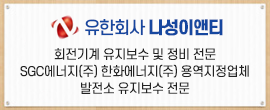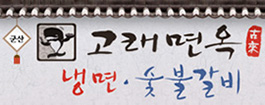논쟁이 뜨겁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와 농업계, 진영과 진영...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면 매입한다. 혹은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매입한다. 쌀의 정부 매입을 법률로 강제한 것이다.
쌀이 농민의 업과 소득의 의존도가 높으니 가격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펄쩍 뛰었다. 대립이 격화되었다. 전 정부 때의 일이었다.
공수가 바뀌고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상황. 여전히 고민하는 쪽은 농림축산식품부다.
쌀 생산량 감량 장치를 조건부로 내세웠다. 쌀 생산조정제, 즉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이다. 현재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반드시 과잉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매입 비용이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참 즉대적인 판단이다.
이해를 하지만 답답하다. 둘 다 농민을 위한 일인데 왠지 미완의 정책-농민을 위하는 듯하지만 종국에는 그렇지 않은 정책-일까 봐 속이 끓는다.
수비 농정이다. 의무 매입은 익숙해지면 또 과비하여 다수확하는 구조로 빠질 것이기에. 타작물은 정책의 구멍을 더 크게 할 뿐이다.
되돌아 현장의 실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눈치 보느라 못한 말들을 들어야 한다. 또 다른 유의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산입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수정을 각오해야 한다.
그토록 모질도록 토론하며 샅샅이 살펴봤는데 놓친 변수가 있을 리 없을 텐데.. 그럼에도 온도를 좀 낮춰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수확 후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전문가는 다 알고 있었다. 벼 품종 제한 정책의 오류를, 논 타작물 재배의 불합리를. 통계청 연도별 시군 단보당 쌀 생산량을 톺아보라. 쌀 과잉의 주범(?)으로 몰린 특정 품종들, 그 지배 지역의 단보당 쌀 수량이 해마다 압도적인지를. 준조생종이 우세인 일본은 단보당 쌀 평균 수량이 우리나라보다 많다.
우기에 논에 재배하는 밭작물인 논 타작물은 재해 보상금도 타고 보조금도 받는다는 “복불복 현상”으로 비친다. 다 농업 현장에는 비정상 신호다. 정책 실패로 가는 사례를 차곡차곡 쌓는 일이다.
그렇다면 쌀 수량은 줄이면서 제값 받는 대안이 있을까? 있다. 의무 매입 조항인 안전선은 그대로 두는 대안이다. 의무 매입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격과 품질을 잡을 수 있는 정책. 좀 더 실리적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려 한다.
첫째, 제현율에 단백질 기준(6.5%)을 추가하여 벼 수매 방식을 혁신하고 쌀시장을 재편해야 한다. 쌀 다수확의 원인은 품종보다 시비이다. 시비량과 수량은 벼 쓰러지기 전까지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시비량 과다가 쌀 과잉은 물론 쌀 품질 저하, 병해충 증가, 토양․수질 오염 가중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쌀 단백질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시비량이 많으면 수량은 늘지만 단백질 함량은 증가한다. 쌀 품위와 밥맛은 급격히 떨어진다. 단백질 기준이 생산과 소비 현장에서 정착하면 쌀은 지금보다 5~10% 생산량이 준다.
쌀 한 가마니에 20만 원 구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덤으로 생물의 다양성은 확장된다. 농가 경영비는 낮아진다. 쌀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요동치는 기후에 딱 맞는 정책이다.
둘째, 그래도 쌀 과잉이 문제라면 ‘논 타작물 재배 정비기반’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 김제시 논콩 재배에 맞는 기반 정비사업을 ‘원예작물 노지 스마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여 재설계하면 될 것이다.
필자가 제안했던 저수지를 활용한 ‘첨단영농복합단지’ 밑그림을 참고할 만하다. 논과 밭의 중간 형태로 유사시엔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하는 게 답이다. 그래야 재배 면적에 의한 생산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판판이 물난리로 헛심 빠지는 일은 없게 된다. 어차피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K-농업의 부흥을 이끌려면 평야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간 고생한 김에 새 정부에서 새판짜기 농정으로 적극 검토하기를 희망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공수가 조화를 이루는 이재명식 농정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세상 아닐까.
<외부칼럼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