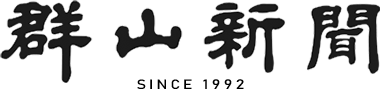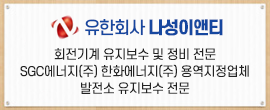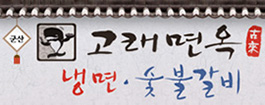늙어가는 농촌, 고이는 농업을 어찌 볼 것인가? 베이비 부머들이 농촌에 정착하리라는 당초 기대는 빗나갔다. 2022년 이후 귀농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년 대비 20%나 감소했다.
충격이다. “해 보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의료, 교육, 문화.... 곳곳에서 ‘편익’을 요구하는 파열음이 났었다.
이후로 다시, 귀농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농의 열차를 탔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낚싯대가 아니었을까?
농촌에 정착하려는 2040 청년농들이 겪는 고민도 이와 결이 유사하다. 귀농이고 창업이니 말이다. 농촌 진입의 첫 문은 ‘교육’이다. 제2의 문은 ‘자금’이다. 문제는 자금이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최대 5억 원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대출한다.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연리 1.5%이다. 거저 주는 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한 귀농 청년농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 보자. 청년 A는 먼저 (0.4ha)를 1억6천만원에 구입한다. 그 부지에 연동형 스마트팜을 신축하려고 한다. 추가 비용은 6억원이다. 잔여 대출액 3억4천만원, 이에 상응하는 담보 물건이 있어야 5억원을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억원을 초과하는 2억6천만원은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시중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자산이 많지 않은 나이대다, 담보에서 막힌다. 그것뿐인가. 3천만원 정도의 경영비는 별도이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스마트팜 신축비의 50%는 그들에게는 생명수다.
비닐형 스마트팜 0.33ha(1천 평)을 짓고 운영하는 최소 7억 9천만 원이 소요된다니.. 누가 농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 청년 A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다수는 담보가 부족하여 5억 융자를 다 채우지 못한다.
더 지을 수도 부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담보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청춘이 저당 잡힌 기분이 든다. 그래서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입 문턱은 국가가 나서 낮춰야 한다.
관련 실습과 교육을 마친 많은 청년들이 보조금 순서를 마냥 기다린다. 진이 빠진다. 중국, 동남아, 중동에서 이런 준비된 청년들에게 스카우트 손길을 뻗친다. 인재 유출이다.
다른 청년 B를 보자. 어찌어찌하여 마련한 담보로 논 1.27ha를 샀다. 벼농사 소득은 10a당 74만4,000원, 논콩은 108만8,000원이다.(2024) 청년은 논콩을 선택했다.
연 소득이 1,381만원7,000원. 이를 모두 5년 거치 기간 동안 저축한다면 6,908만5,000원을 모을 수 있다. 20년 균분 상환액의 15%에 못 미치는 액수다. 결국 논금이 올라야만 대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이다. 투기를 좋은 정책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청창농을 위한 정책..... 뻔한 거짓말 같은 정책에 청년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염치 없는 일이다.
그나마 여유 자금이 있는 청년도 규제의 규제, 일상 감사의 비합리성... 그들만의 속도에 화가 난다. 작물 입식 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농업 현장이 교과서다. 속도와 방향이 있다. 이를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행정이다. 그게 대전환의 시발점이어야 한다. 하여 자발적으로 정책 개선 건의도 하고 시급한 일은 패스트 트랙을 태우자고 결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다음 판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정책 실패로 아프다. 농촌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농업소득은 연평균 1천만 근방을 배회한 지 오래다. 연평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18.7%, 농업 외 소득 39.8%, 이전소득 36.1%, 나머지가 비경상소득이다.(통계청, 2024) 농업 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
대부분 농가들은 농업 외 소득, 즉 농업 보조금 없이는 농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 대안은 공공비축 농지 확대, 임시 거주지 확보, 신용/후취담보 대출 도입, 스파트팜 패키지 지원/사업단가 현실화, 추진절차 간소화/전문화, 정착농 페이백 제도 신설 등의 키워드에 답이 있다.
지금이라도 청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차세대 농업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외부칼럼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