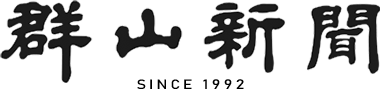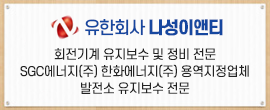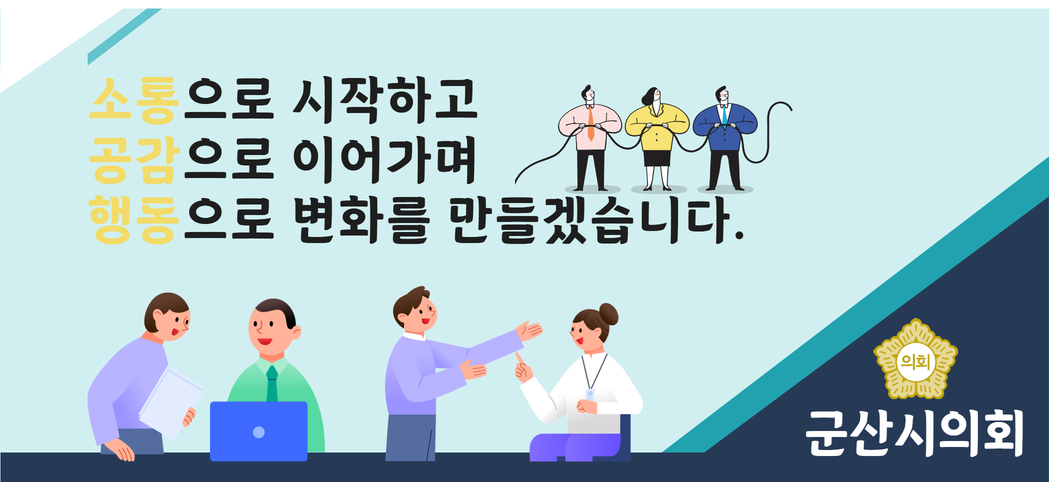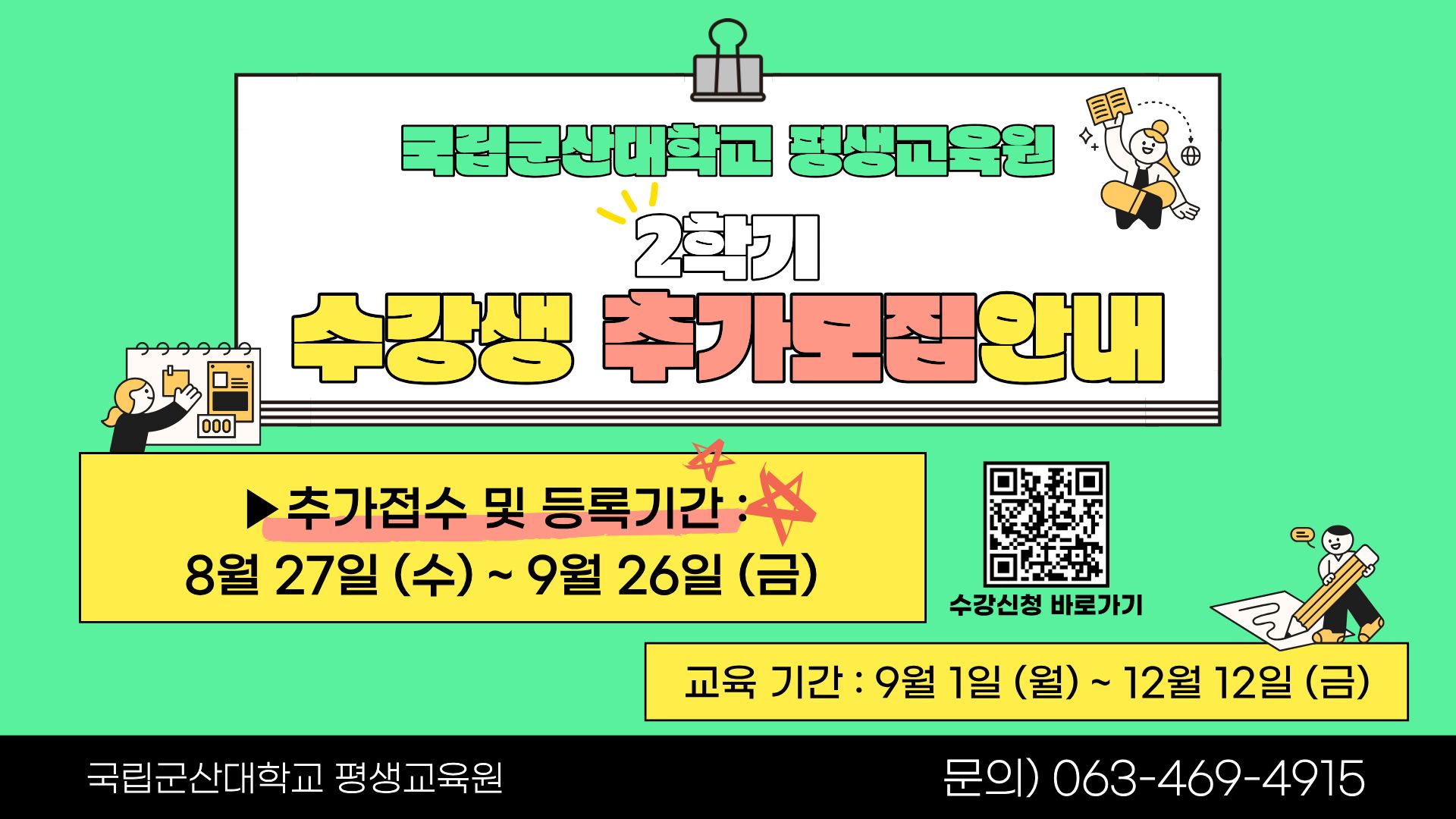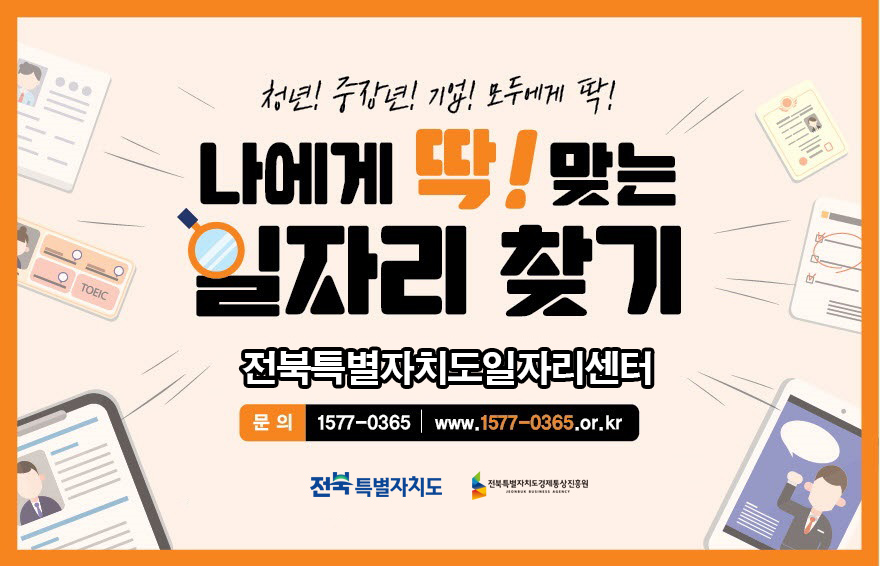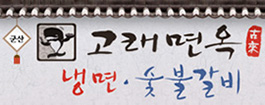S 대병원 N의학 정보에서 화병(hwa-byung)을 이렇게 정의한다. “명치에 뭔가 걸린 느낌 등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으로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질환”.
그 원인은 스트레스다. 덧붙여 한국 특유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기인한 결과로 본다. 그래서 화병을 ‘문화 특정 증후군(culture-bound syndrome)’으로도 부른다.
그 증후군은 “참아야 하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가부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꽉 막힌” 문화 구조에서 잉태한다. 우열, 격차. 소외 속에서 오장육부의 어디에 울화, 분노, 답답함이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12.3 내란 이후 우리는 화병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광장에서 절절한 분노를 토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억압을 기획한 자들은 파렴치한 낯을 드러냈다. “누가 다치기라도 했느냐?”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할 말을 잃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미국 구출설”, “계엄 옹호”... 2차 가해. 꺾인 울화를 도지게 했다. 급기야 지난 7월 25일, 법원은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다.”라고 했다. 화병의 대가 치고는 너무 ‘싼거리’다. 요새 쌀 2말 정도 금액이다.
수괴는 늘 군주처럼 굴었다. 국민은 단지 권력 실험 대상이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한 그는 군대를 들였다. 강제로 군용 트럭에 실려 나가는 상상을 하게 했다. 그들이 노린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극단적 분노를 가학적으로 소비하는 세상, 권력 나르시시즘이 판치는 세상, 대의 민주주가 사라진 세상....그 답을 그는 손바닥에 새긴 ‘왕’ 자로 미리 보여줬던 것은 아닐까. “누구든 왕의 손바닥 안에 있다.”, “말하는 것, 듣는 것은 짐만이 하는 것이다”,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다.”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힘을 누리는 것으로 권력을 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한다. 그 권력이 작든 크든 우리 사회에는 그런 권력의 변이들이 적지 않다.
권력 맛을 들이면 윤리는 껌값이다. 인지부조화, 그가 그랬고 그들이 그랬다. 이해와 설득, 소통을 멈춘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커진다. 화가 얼굴에 드러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마저 ‘문화 특정 증후군’에 몰아넣는다. 국가는 생기가 없어지고 사회는 우울해진다. 이걸 그는 “자신의 계몽이 통했다.”라고 자위한다.
이런 가해자의 흔한 특징은 ‘거짓말’이다. 감추려, 방어하려, 보여주려, 거부하려, 더 있어 보이려...없는 말, 다른 말, 틀린 말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행여 들키면 화를 낸다. 불같은 분노로 거짓과 무지를 정당화한다. 그러곤 권력에 숨어버린다. 마치 허구의 세계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는 ‘리플리 증후군’처럼. 그는 벌거벗은 임금이 된다.
그런 권력은 더 중독성이 있다. 뇌의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고통에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 한다. 조언을 듣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 이기와 위선의 ‘끝판왕’으로 군림한다. 권력 중독은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깨진다. 갈등은 증폭된다. 사람들은 명치 근방에 통증을 느낀다.
국가 권력, 지방 권력, 공권력, 사권력 등등.. 셀 수 없는 권력과 그 기득권들. 각각은 그 권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권력은 가변적이다. 그러니 그들을 견제와 균형의 우리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막지 못하면 탈이 난다. 마약을 능가하는 쾌감과 희열을 주는 게 권력이다.
하여 권력자는 때론 ‘위험물질’과 같다. 우리를 이탈한 권력은 발화하거나 폭발한다. 화가 인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위험물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도처에, 근처에 만연해 있는 권력의 풍경들, 이참에 다시 그려야 한다.
<외부칼럼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