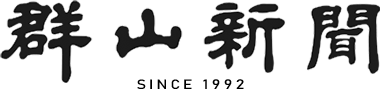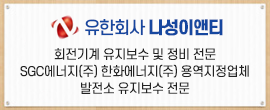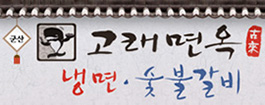‘거의 중간쯤 되는 곳에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두루뭉술하다’, ‘시간이나 시기가 이러기에도 덜 맞고 저러기에도 덜 맞다’, ‘어떤 정도나 기준에 꼭 맞지는 않지만 어지간히 비슷하다’... “어중간함”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정리하면 명확한 경계나 확정적인 상태가 아닌, 경계선 상에 있거나 양극단 사이에 위치하는 모호한 상태를 칭한다. 더하여 “정말 어중간함”은 경계의 중심에 더 가깝거나 혹은 양극단에 더 치우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삼국지...조조는 한중 지역을 공격하려 했으나 유비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진격하기 어려웠다. 하여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식사로 나온 ‘닭갈비’를 보며 ‘먹자니 살은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모양이 자신과 같은 처지로 투사되었다.
결국 군사를 물리는 결단을 한다. 거기서 나온 “계륵”, ‘계륵같다’는 말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이때 조조가 “전진”을 명령했다면 수많은 병사를 잃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어중간함” 벗어나려는 리더의 선택은 후과로 드러난다. 그 후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후과를 두려워 하는 리더는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공간을, 경계를 탓한다. 용맹하지 못한 군사를, 보좌에 허술한 책사를 나무란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지 부조화, 무기력, 이기적 성향, 자신감 부족, 사회적 분위기 등...그 변명의 무기를 들이댄다. 도망치거나 감추거나 오리발을 내민다. 환경을, 정책을, 자본을, 역량을 핑계 삼는다. 이는 마치 ‘다른 어중간함’으로 ‘어중간함’을 덮는 꼴이다.
무책임한 리더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설득을 어려워한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부하들의 감정만 자극한다. 언행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 조직의 탄력성은 물러진다. 조직원들은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제발 해결책을 내놓으라”라고 성을 낸다. 때론 일보다 화합을 강조한다.
별안간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 직장’을 설파한다. 악순환의 괘에 들면 사회는, 직장은 ‘묵음’으로 변한다.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쓴소리는 사라진다. 거기서 거기인 인간형을 벽돌처럼 찍어낸다.
“문명 대전환기”에 둘어섰다. ‘청동’에서 ‘철’로 넘을 때 파장보다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노동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AI 시대를 대비하여 사람이 '놀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빌 게이츠는 언급했다.
그는 ‘놀이’와 ‘휴식’의 균형을 찾는 노력을 미리 주문했다. 곧 맞을 AI 시대, 사물과 현상을 읽는 방식, 일 하는 방식,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을 확 바꾸라는 말이다. 여기에 통찰력 있는, 판을 읽는, 노련한 리더는 필연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에쓰모글루 외, 2021) 초반에 담장을 두고 갈라진 2개의 노갈레스 시(市) 사례가 나온다. 담장 북쪽 미국 애리조나주와 담장 남쪽 멕시코 소라노주는 마주하는 지역이다. 분리 담장이 있을 뿐 지리, 기후, 조상, 문화, 음식이 거의 같다.
이들은 원래 같은 시민이었다. 1918년 아무스 노갈레스 전투 이후 장벽이 세워졌다. 분단 90여 년이 흐르자 두 도시의 삶은 극명한 차이가 났다. 남쪽은 북쪽의 가계 수입 1/3, 높은 영아 사망률과 낮은 평균 수명, 치안 부재, 공중보건 열악... 삶의 질 면에서 전혀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제도’에서 찾는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에 전라남도가 눈에 띈다. AI 수도, 재생에너지 수도를 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 AI 산업생태계 육성, AI 농업플랫폼 구축, 분산에너지 특구, AI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후에너지부 유치..유치했거나 유치할 사업들을 묶은 ‘통째로’ 전략이다. 당연히 자본과 에너지가 사방에서 몰린다. “경천동지”라고 했다.
이들은 어떻게 ‘정말 어중간한’ 지정학적인 불리함, 지방자치의 미숙을 털어냈을까? 조직의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좌고우면 아니하고 책임지며 묵묵히 깨어있던 사람들, 그들이 연 것은 분명 문명의 첫 장이었다.
<외부칼럼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